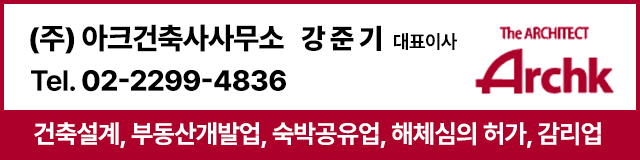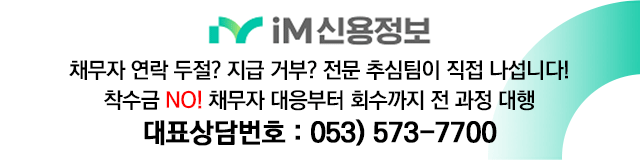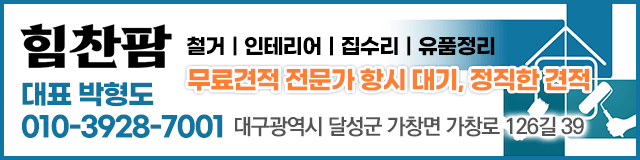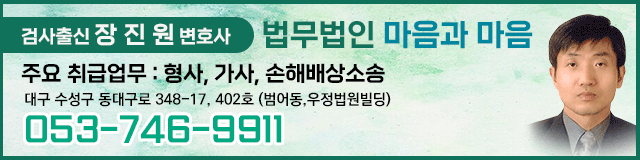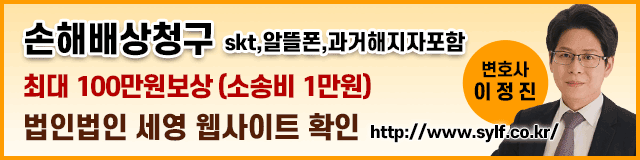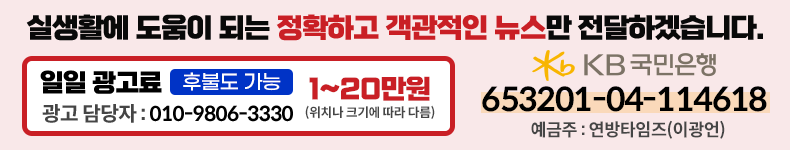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의 올해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달러·원 환율이 급등한 영향이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최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국제 비교 지표인 올해 달러 기준 명목 GDP를 1조8586억 달러로 추산했다. 지난해 1조8754억 달러보다 168억 달러(0.9%) 줄어든 수치다. 2023년(1조8448억 달러)과 비교해도 2년간 138억 달러(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원화 기준으로는 명목 GDP가 지난해 2557조원에서 올해 2611조원으로 2.1%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이 GDP 증가분을 압도하면서 달러 환산액은 오히려 줄어들 게 되는 셈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환율 변동성이 중대한 경제적 위험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일시적으로 외환시장 유동성이 얕아지고 환율 움직임이 가팔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율 추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달러 GDP 규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당국의 대응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에서 고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환율 움직임에 따라 ‘GDP 2조달러’ 달성은 물론 이르면 내후년으로 예상되는 1인당 GDP 4만달러 입성도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가파른 환율 상승이 이미 2%대 중반까지 오른 물가 상승세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1.7%까지 낮아졌지만, 9월 2.1%, 10월 2.4%로 태세를 전환하며 1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지난달 2.2%로 이보다 낮았으나,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 지수는 두 달째 2.5%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는 물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식료품과 연료 가격이 오르면 체감 물가가 높아진다. 여기에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하면 대출이자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필수품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일수록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금융 취약계층은 이자 부담도 더 크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은 기업에도 충격을 준다. 수입 원자재·부품 가격 상승은 생산비 증가를 부르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를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환율 위험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일수록 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추가 환율 상승에 대비한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