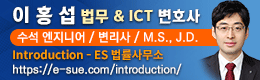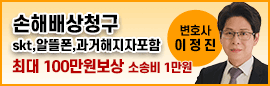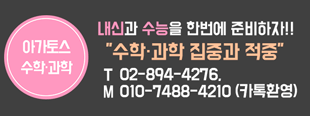서울역사박물관, 서울미래유산 기록의 세 번째'서울의 이용원'발간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서울역사박물관장은 2022년 서울미래유산기록 사업의 결과를 담은'서울의 이용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기록되지 않은 근현대 서울을 미래세대에 전할 귀중한 역사로 인식하고, 현재 서울을 기록하는 자체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서울미래유산기록’ 사업은 서울 식문화의 상징적 장소인 ‘낙원떡집’을 시작으로, 도시 제조업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서울의 대장간’을 이미 조사한 바 있다. 서울미래유산기록 세 번째는 ‘서울의 이용원’이다.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이용원은 단 2곳뿐이다. 2013년에 종로구 혜화동의 ‘문화이용원’과 마포구 공덕동의 ‘성우이용원’이 지정됐다.
서울에는 약 14,000여 곳의 이용원이 존재(2022.9.30. 기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한다.
그중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이용원’과 ‘성우이용원’은 100여 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시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전통 방식의 이용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1895년 단발령을 계기로 지금의 이용원을 뜻하는 ‘개화당 제조소’가 탄생했다. 한국인 최초의 이용원인 ‘동흥이발소’는 1901년 유양호가 인사동 조선극장 터에 개업했다. 황제 전속 이용사였던 안종호는 광화문 근처에 ‘태성이발소’를 열었다.
서울(경성)에는 일본인 이용원이 가장 먼저 생겼고, 조선인 이용원과 중국인 이용원이 그 뒤를 이어 개업했다. 1915년에 서울의 이용원은 226개였는데, 조선인 이용원이 140개소(62%)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 이용원이 70개소(31%), 중국인 이용원이 15~16개소(7%)로 가장 적었다.
중국인 이용원은 지금의 중구 지역에 밀집해 있었는데, 상호에 ‘당(堂)’ 자를 붙였다. 1910년 소공동에 용승당, 석정동(을지로1가·소공동·태평로2가)에 복덕당, 대정동(정동·무교동·태평로1·2가)에 덕발당, 정동에 복성당, 시동(을지로3가·입정동·수표동)에 장성기, 낙동(명동)에 류학청이 영업했다.
서울의 이용원 전성시대는 1960~1980년대 초였다. 1974년 6월부터 서울시경은 장발족 무기한 단속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엄격한 두발 규정을 적용받았다. 관공서는 물론, 큰 회사와 빌딩, 학교·호텔·목욕탕에 이르기까지 구내 이용원이 설치됐다.
현재(2022.9. 기준) 서울의 이용원 수는 약 2,500곳이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35곳으로 가장 많고, 서대문구가 65곳으로 가장 적다. 하지만 이를 이용원과 바버숍으로 나눠보면 이용원은 영등포구가 128곳으로 가장 많고, 용산구가 57곳으로 가장 적다. 반면, 바버숍은 강남구와 마포구가 24곳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단 1곳에 불과하다. 중년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원은 구도심과 외곽에, 바버숍은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강남과 마포구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화이용원은 1940년대에 처음 문을 열었다. 6·25전쟁 중 창업자가 실종돼 전후 이상기 이용사가 들어와 1954년 현 위치(종로구 혜화로 7)에 이전했다. 손님이었던 지덕용 이용사는 17세에 보조원으로 문화이용원과 인연을 맺었다. 1969년 이용원을 인수한 그는 2022년까지 문화이용원에서 67년의 세월을 보냈다.
1970년대 이전 혜화동은 지금의 강남에 견줄 만한 부촌富村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문화이용원은 기업인‧정치인‧교수‧문인의 사랑방이었다.
현재 혜화동에 소재한 학교는 동성중·고등학교, 혜화초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다.
1970~1980년대에는 혜화여자고등학교와 보성고등학교도 혜화동에 교사校舍를 두고 있었다. 주변에 학교가 많다 보니 장발 단속과 관련한 일화도 있다.
성우이용원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이용원이다. 1928년 현 위치(마포구 효창원로97길 4-1)에 우리나라 이용 면허 제2호 서재덕이 개업했다. 1935년 사위 이성순이 대를 이었고, 1971년부터 아들 이남열이 뒤를 이어 3대째 운영 중이다.
이남열이 생각하는 좋은 이용사의 첫째 덕목은 ‘도구를 소중히 다루는 자세’다.
훌륭한 연장은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면도날은 선풍기 바람에도 날이 상할 수 있어 절대 바람에 노출하지 않는다.
가위와 면도칼뿐 아니라 빗도 빗살을 갈아 다듬어 사용한다.
성우이용원에서 사용하는 도구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50년 된 독일제 면도칼이다.
이남열 이용사가 가장 아끼는 가위는 1968년 이발을 시작하며 당시 일주일 치 임금이던 700원에 구입한 것이다.
이용업계는 이용재료상을 중심으로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특별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고 있다. 1970~1990년대 서울에는 종로와 청량리에 가장 많은 이용재료상이 있었는데, 청량리 로터리 일대에만 100여 개의 이용재료상이 있었다.
당시의 재료상은 취업 알선과 인력 공급을 담당하며 이용업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자리가 필요한 이용사들은 재료상에서 대기하거나, 구직 의사를 알렸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이용원에서 커트·드라이 등 필요한 분야의 기술을 가진 이용사를 모집해 데려가는 방식이었다.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도 했는데, 지금의 공인중개사처럼 이용 업소의 운영권을 재료상을 통해 거래했다. 이용원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재료상에 매물을 내놓으면 인수할 사람을 찾아 거래를 맺어주었다.
과거 이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용원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았다.
해방 이후 고등기술학교 등 직업교육 기관이 설립됐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 이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서울시에 소재한 학원 중 직업기술 분야에서 이·미용 교습 과정은 176곳에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미용만 교습하는 곳을 제외하면 ‘이용 학원’이라 칭할 수 있는 곳은 16곳(강남구 3, 동대문구 3, 송파구 2 등)이다. 학교의 경우 이·미용 관련 전공이 개설된 40개 학교 중 은평문화예술학교와 정화예술대학교에만 이용 전공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1946년 전국이용사연합회가 발족했다. 이후 1961년 한국 환경위생 협회이용분과위원회, 1966년 한국이용사회 중앙회, 1970년 한국 이용업 중앙회, 1972년 한국 이용사 중앙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1980년 대한 이·미용사회 중앙회가 창립되어 이용과 미용이 통합되면서 해산됐다. 하지만 이·미용사회가 창립 2년 만에 해산되어 1982년 한국이용사회 중앙회가 창립해 현재에 이른다.
2010년대 후반부터 복고가 유행하면서 이용원을 뉴트로로 재해석한 바버숍이 탄생했다. 현재 서울의 이용업은 기성세대를 주축으로 한 이용원과 젊은 세대의 바버숍으로 이원화된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여 2022년 2월 한국 바버숍 위원회가 발족해 바버숍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서울미래유산기록3) 서울의 이용원'보고서는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입은 서울책방 또는 서울역사박물관 뮤지엄 샵 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