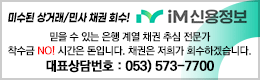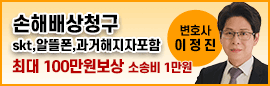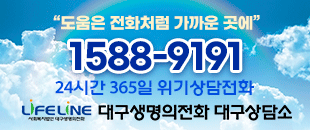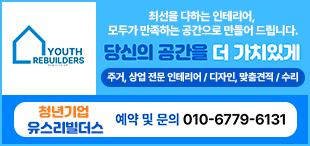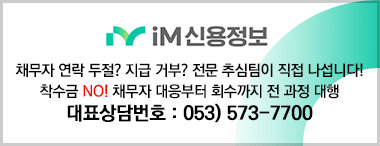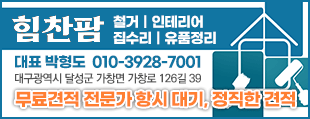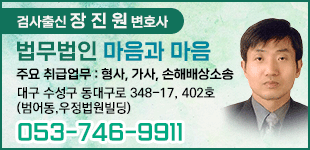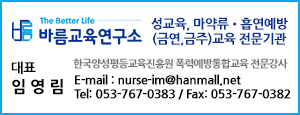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의 온기가 청년층 고용시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수출 경기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측돼 청년층의 어려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낮아졌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7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당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경기 부진 등 여파로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간 하락했다.
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을 뜻한다. 취업자 수 증감과 달리 최근 인구 감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양호한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취업문을 좁히고 청년의 구직 의욕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9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여파로 6만1천명 줄며 15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천명 줄었다. 작년부터 계속된 건설업 불황으로 17개월째 마이너스다.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었지만 주로 단기직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오히려 14만6천명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경력직 위주의 채용 기조도 청년층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런 최근 상황은 외부의 일시적 충격으로 청년 고용시장이 악화했던 과거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과거 청년층 고용률이 고전하던 때는 모두 외부 악재가 주된 원인이었다. 고용률 하락세는 외부 충격이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
금융위기 때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때도 상황이 나아지면서 15개월 만인 2013년 9월 반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하락하다가 회복했다.
하지만 최근 청년 고용 한파는 잠재성장률 부진, 채용 기조 변화 등 내부의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